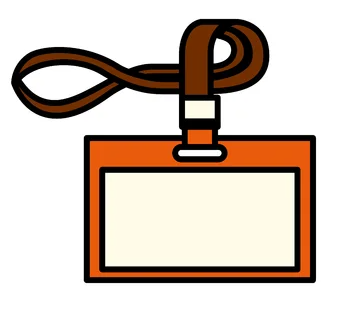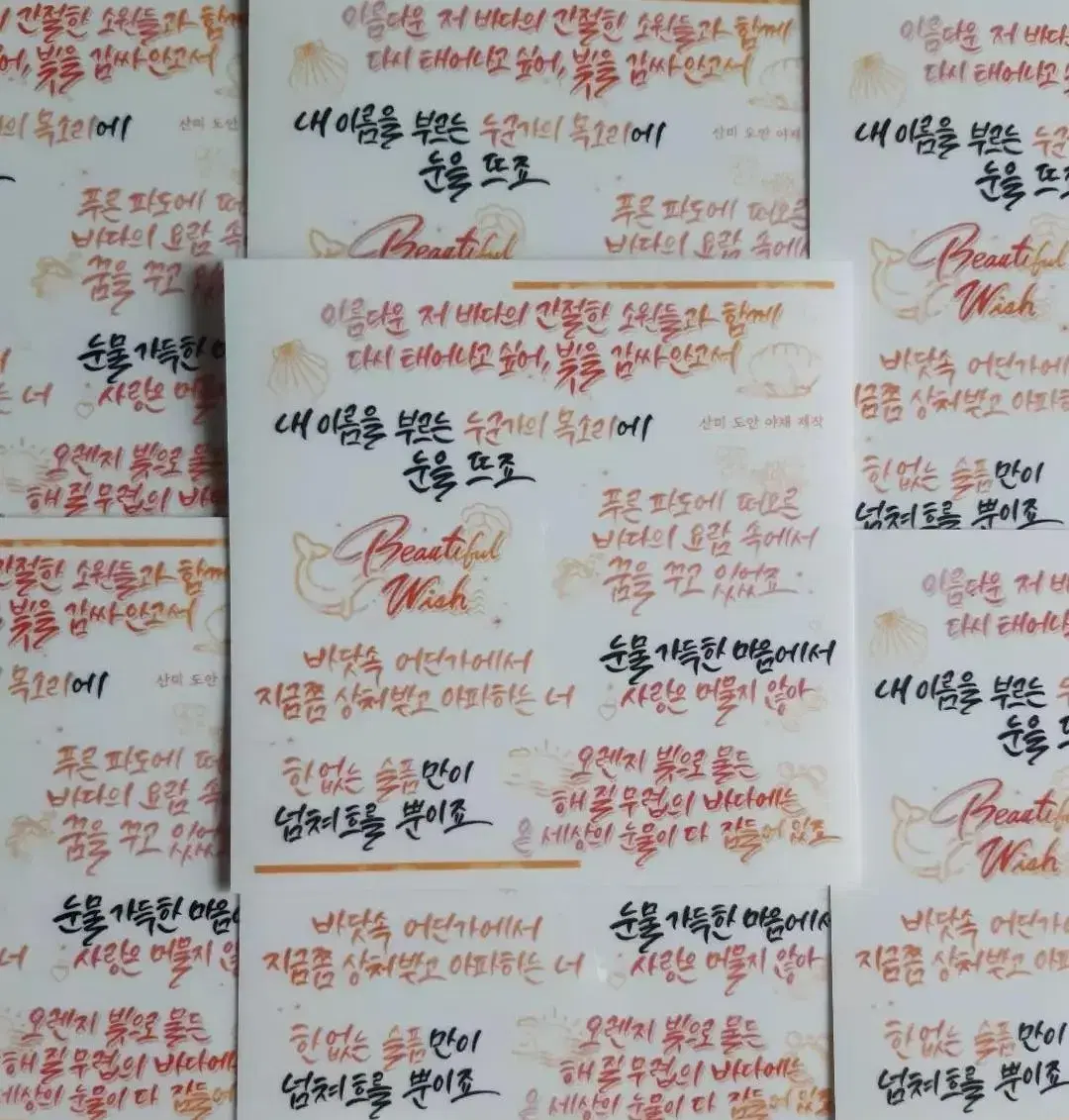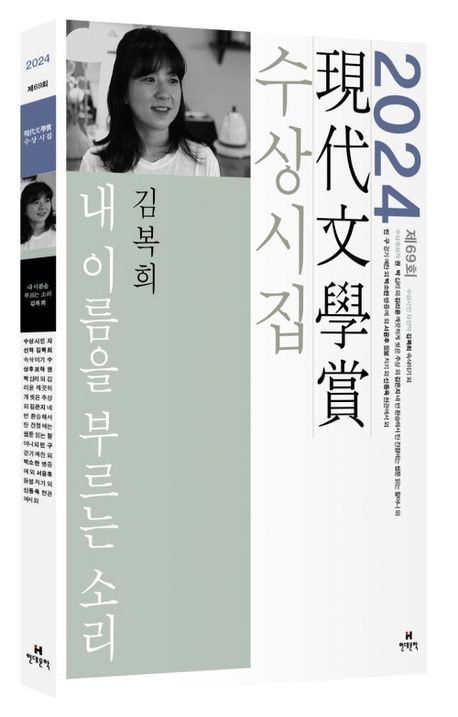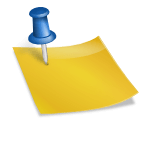나의 노동으로 내 노동으로 오늘을 살겠다고 결심한 게 언젠가 머슴처럼 바친 청춘은 모두 뭔가, 돌이킬 수 없는 젊은 날의 실수는 모두 뭔가 그 여자의 입술을 노리던 나의 거짓말은 전부 무엇인지, 그 눈물을 달랬던 내 피에로 표정은 모두 뭔가 그 마른 흰 손가락은 무엇인가.자신의 맛도 모르고 밤새도록 술 마시고 이 버릇은 무엇?그리고 친구이다, 모두가 창백한 얼굴로 명동에 찾아오는 친구의 여성들을 만난 이 습성은 무엇인가.또 절반을 살더라도 절반을 달성하지 못한 이 답답한 목숨의 미련을 삭이는 이 어리석음은 무엇인가.이것은 무엇입니까.이런 일이 다 무엇일까, 내 노동으로 오늘을 살겠다고 결심한 게 언제인가.나의 노동으로 오늘을 살겠다고 결심한 게 언제인가.이 시에서 화자는 자신의 땀과 노력으로 건강에 살지 못한 자신을 반성하고 있다.자신의 인생의 주인이 스스로 못해”머슴처럼 ” 살아온 젊은 시기와 그것에서 비롯된 ” 돌이킬 수 없는 “실수를 반성하고 있다.또 무슨 일에도 정성을 다하지 못하고 거짓으로 “여자의 입술을 유혹했다”허위와 자신이 갖고 있던 표정이나 동작 신체의 일부까지도 자책하며 전면적 자기 부정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이 시는 시를 모르고 성실하게 사회의 일원으로서 노동을 하고, 그런 혼자가 되려는 도덕적 마음 결장성을 표현하는 것처럼 보인다.그러나 표상된 의미 뒤에는 실제로 전위적 모더니스트의 유전자를 지닌 그가 의고적 또는 지사적 태도를 견지해야 하는 어려움이 녹아 있다고 보는 게 옳다.

나의 노동으로 나의 노동으로 오늘을 살기로 결심한 것이 언젠가 머슴처럼 바친 청춘은 모두 무엇인지, 돌이킬 수 없는 젊은 날의 실수는 모두 무엇인지, 그 여인의 입술을 겨누던 나의 거짓말은 모두 무엇인지, 그 눈물을 달래던 나의 광대 표정은 모두 무엇인지, 그 야위고 하얀 손가락은 무엇인지.자기 맛도 모르고 밤을 새워 마시는 이 술버릇은 무엇인가. 그리고 친구여, 모두가 창백한 얼굴로 명동에 모여드는 친구의 여인들을 만나는 쓸쓸한 이 습성은 무엇인가.반을 더 살아도 반을 채우지 못한 이 답답한 생명의 미련을 물어뜯는 이 어리석음은 무엇인가.이것은 무엇인가.이런 게 다 뭔지, 내 노동으로 오늘을 살자고 결심한 게 언제인지.내 노동으로 오늘을 살기로 결심한 게 언제인가.이 시에서 화자는 자신의 땀과 노력으로 건강하게 살지 못한 자신을 반성하고 있다. 자신의 인생의 주인이 스스로 하지 못하고 ‘머슴처럼’ 지내온 젊은 시절과 그로 비롯된 ‘돌이킬 수 없는’ 실수를 반성하고 있다. 또한 매사에 진심을 다하지 못하고 거짓으로 ‘여자의 입술을 유혹했다’ 허위와 자신이 가졌던 표정이나 동작 신체 일부까지도 자책하며 전면적 자기 부정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 시는 시를 모르고 성실하게 사회의 일원으로 노동을 하는 그런 한 사람이 되려는 도덕적 염결성을 표현하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표상된 의미 뒤에는 실제로 전위적 모더니스트 유전자를 가진 그가 의고적 혹은 지사적 태도를 견지해야 하는 어려움이 녹아 있다고 보는 것이 옳다.

거리의 하늘과 훨씬 떨어지면서 나는 혼자 있다.모르는 이름과 함께 마음이 되며 그 얼굴, 당신은 지금 어느 창문에서 무엇 때문에 혼자 해야 하는가.흔한 청춘의 정글의 많은 몸짓 속에서 나는 무엇 때문에 고독하지 않으면 안 되는가.가서 버린 얼굴과 함께 꽃잎이 떨어지고 떨어지는 꽃잎과 함께 무엇 때문에 나는 혼자서 밤을 밝히는 것인가.이 시의 서정적 자아의 시선은 “창문”이라는 경계 밖에서 안을 들여다보기도 한다.특히” 모르겠다./이름이 함께/ 궁금하다 그 얼굴/너는 지금/어느 창에서/도움/혼자 해야 하는가”라는 시행은 안팎 경계 밖에서 잠긴 속을 들여다보며 시선이다.비록 잠기고 있지만 창문을 통해서 짝사랑하는 여성의 모습을 볼 수 있는 은밀한 속을 들여다보았다.이는 서정적 자아의 시선이 덮고 차이의 경계에서 차이를 지향한다는 의미이기도 하다.그러나 창문의 차이는 서정적 자아의 차이다.은밀한 공간으로 투병하는 한 여성의 마음의 차이가 아니다.여기서 창문의 차이는 그 병실의 닫힌 공간의 투병 생활에 경험할 수 있다.이는 시에서 적당하게 표현하고 적당히 감추는 절제된 이미지이기도 하다.결국 서정적 자아는 창문을 응시한다.서정적 자아의 시선은 은밀한 닫힌 공간을 개방 공간으로 전환하는 창문이 의미를 부여한다.” 다른 “의 주·정아, 나는 취한 명동에서 취한 종로에서 취한아, 하지만 이런 것이 없는 세상은 정말 이런 게 아니다 나는 취한 나를 누가 멸시해도 도대체 세상은 이게 아니다 사상?모르겠어。그래도 세상은 이런 것이 아니다.철학? 모르겠다 하지만 세상은 이런 게 아니다 아니 미국도 NO소비에트도 니 에토 닛폰 그렇지 않은 인도어는 모르지만 그렇지 않다 한국 한국은 정말 그렇지 않다 게다가, 저는 이런 것이 아니라 사랑!이런 거 말고, 생활 이런 것이 아냐 오늘!이런 것 아닐까 명동, 명동에서 나는 취한 그러나 명동도 이런 것이 없는 세계의 명동, 세계의 종로, 그런 것은 없는지 세계의 명동에서 나는 술 버릇이 하고 싶어 이런 것 아닐까 이런 것 아닐까 쇼팽 베토벤, 카프카, 사르트르를 누구, 자네들 다 그렇지 않다.싼 술 몇잔을 마신 가운데”아니 아니”의 노래도 하지만 맑은 시의 깊은 슬픔은 어떻게 왜 어떻게 달랜지 난 취한 명동에서 취한 종로에서 취한 나는 나는 이런 것이 아니라 해학성을 갖춘 정치 풍자 노래다.시적”화자가 주정을 받고 현실을 말하고 『 다른 』다는 부정을 반복하여 현실을 반어적으로 비판하며 쇼팽, 베토벤, 카프카, 사르트르를 대화하도록 『 너희들 』라고 부르는 방식이 그렇다.해학도 풍자와 함께 저항을 나타내는 한 수단”으로 작용하고 있다.이 시에서 좌절하는 것은 ” 다른 “이라는 부정의 메시지이다.”아니오”를 통해서 부정하는 것은 “세계/사상·철학/국가/사랑/생활/현재의 시공간/예술”이다.” 다른 “이란 시어가 반복되고 강조될수록 부정하고 회의하는 시적 주체가 원하는 것이 더욱 애매하게 된다.하나하나를 부정하고 회의를 할수록 주체의 자리가 없다.반복되는 ” 다른 “이 거느리고 비리 어사는 곧은 합치점을 위한 변증법적 지양이 불가능한 시대의 문맥을 거느린다.이 때 부정과 회의는 현실에서 새로운 가능성 찾기가 아니라 가능성을 조목조목 소거하는 뺄셈의 논리다.시의 마지막에 이르고 취하는 것은 제가 아니라 제 대신”아니오”라는 강한 메시지 자체이다.

연령의 어느 날, 들판에 청자색의 세굼파리 같은 것이 석양에 반짝 빛나는 것을 보았다.어느 날 여자의 머리 같은 것이 쓰레기 통 옆에 버려진 것을 보았다.어제는 지나는 길에 무심코 오열하는 흉내를 내면서 웃었다.오늘은 아침 양치질 때 칫솔에 대한 피를 보면서 노후의 독신을 공상했다.내일은 그 오래 만나지 못한 우울한 친구를 찾아볼 거.시인의 의식은 현실에 대한 불안으로 민감하게 반응한다.4·19의 환희도 사라지고 민주주의에 대한 희망도 버려야 하지 않는 군부 통치의 시련 속에서 미래에 대한 방향을 잃어버렸다.잃어버린 시적 자아의 심성은 두 사물을 대비시킨다.”들판의 석양에 빛나는 청자색의 사금 파리”,”도시의 쓰레기 통에 버려진 여자의 머리 같은 것”은 현실을 인식한 의식의 총 표제적인 것이다.이 두개의 문장에 나타난 심성은 나중에 오는 두개의 문장에서 어제의 웃음, 오늘의 공상과 대비된다.상기의 시는 과거와 현재 또는 미래에 연결되는 시간의 흐름을 표현하고 미래의 불확실한 현실을 상기하다.끝없는 분단된 조국의 현실을 비판적 시각에서 시사한 것이다.

나이 어느 날 들판에서 청자색 새금파리 같은 것이 석양에 번쩍이는 것을 보았다.어느 날 여자의 두발 같은 것이 쓰레기통 옆에 버려진 것을 보았다.어제는 지나가다가 엉겁결에 펑펑 우는 시늉을 해보고 웃었다.오늘은 아침 양치질을 할 때 칫솔에 묻은 피를 보면서 노후 독신을 공상해 보았다.내일은 그 오래 만나지 못한 우울한 친구를 찾아보려고 해.시인의 의식은 현실에 대한 불안하고 민감하게 반응한다. 419의 환희도 사라지고 민주주의에 대한 희망도 버려야 할 군부통치의 시련 속에서 미래에 대한 방향을 잃고 말았다. 잃어버린 시적 자아의 심상은 두 사물을 대비시킨다. 들판의 석양에 반짝이는 청자색 사금파리 도시의 쓰레기통에 버려진 여자의 두발 같은 것은 현실을 인식한 의식의 총제적인 것이다. 이 두 문장에 나타난 심상은 뒤에 오는 두 문장으로 어제의 웃음, 오늘의 공상과 대비된다. 위의 시는 과거와 현재 또는 미래로 이어지는 시간의 흐름을 표현하고 미래의 불확실한 현실을 상기한다. 끝없는 분단된 조국의 현실을 비판적 시각으로 시사한 것이다.